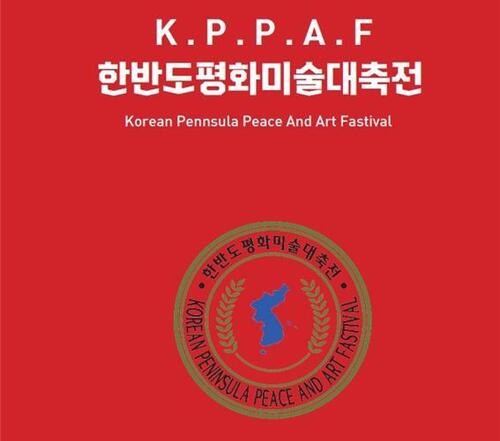|
<스타저널>2011년 명품극단의 새로운 레퍼토리 작품이 온다. 명품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고골 3부작>, <한국문학 3부작>, <죄와벌- 죄를 고백함>에 이어 2011년, 신작 레퍼토리 작품이 선보인다. 바로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과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은 <푸르가토리움, 하늘이 보이는 감옥(獄)>이라는 깊이 있는 순수 창작극이다. 세계 초연으로 일컬어지는 이 작품은 연극이라는 장르가 가지는 본래적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연극무대에서 홀대받고 있는 고전의 무게감을 지닌 작품의 주제를 통해 고급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비판과 질문, 연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다 사고 파는 ‘상품’이 되어버린 오늘날 예술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푸르가토리움>은 관객의 머리에 찬 물을 끼얹고, 고민하고 사색하는 기쁨을 선사한다. 즉, 연극의 본래적 특징을 수행한다. 또한, <고골 3부작>과 <한국문학 3부작>을 통해 그 방법론을 입증 받은 역동적이고 시각적인 연출과 명품극단의 젊은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신체언어로 작품을 이끌어 나간다. 이는 사유의 무게감과 담론의 깊이를 담아내는 동시에, 수준 높은 연극성을 지닌 철학적인 연극, 예술가와 관객 모두 사색하는 연극을 실현한다. 선과 악의 이중성에 주목하다 <푸르가토리움>에서는 가장 아이러니하고 사회성 짙은 측면인, 선과 악의 이중성에 주목했다. 선과 악이 흑백처럼 분명한 도덕교과서와는 달리, <푸르가토리움>에서는 마르멜라도프의 악행이 소냐의 희생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걸인을 도와주는 소냐의 선행은 아버지의 죽음과 집안의 파멸을 가져온다. 이러한 미묘한 관계와 사건의 흐름을 통해 한 인물을 ‘선’ 아니면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떠한 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정의’의 문제를 풀어냈다. 이와 같은 의도와 결과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 관객들이 스스로 ‘과연 진정한 선과 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죄와 벌의 주인공, 신곡에 서다 <푸르가토리움>은 연옥의 라틴어이다. 작가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서 빌려온 주인공들이 발 딛고 사는 이곳을 단테의 <신곡>에서의 ‘연옥’의 이미지라고 설명한다. 연옥은 죽은 자들의 세계이며 그 자체로는 즐거움이란 찾아 볼 수 없는 어두운 지옥의 이미지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인페르노)’이 절망의 장소인데 반해 ‘연옥’은 “인간의 영혼이 씻기어 하늘로 오르게 하는 곳”이라고 하는 연옥편 제 1곡의 노래와 같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보여주는 장소이다. 즉, 이곳은 어둡고 춥고 무서운 감옥이지만 하늘이 보이는 곳이 되는 것이며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이 ‘하늘이 보이는 감옥’에 마르멜라도프와 까쩨리나 이바노브나 부부와 가족들 그리고 원작과는 다르게 걸인이 되어 세상을 관조하는 로지온이 있다. 마르멜라도프를 비롯한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인간들을 대변하는 일종의 희망 없는 시대의 페르소나로서 이 ‘연옥’에서의 시간을 버텨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의 잔혹한 삶은 질문하기 시작한다. 이 부박한 세상 속에서 마르멜라도프처럼 사는 것이 과연 비난 받아 마땅한 ‘죄’인가? 혹시 그가 마셔대는 술이란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맞서는 대응방식이 아닐까? 쏘냐는 가족을 위해 창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신을 모독한 ‘죄’인가? <푸르가토리움>은 도스토예프스키와 단테라고 하는 인류의 두 지성의 사유를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관객과 함께 한다. <저작권자 ⓒ 스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